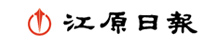고교 NIE 교육 통해서
신문에 대한 흥미 키워
NIE(신문활용교육)를 `내'라고 읽었던 필자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한다. 신문에 대한 첫 기억은 기사의 촌철살인도, 세련된 레이아웃도 아닌 진한 잉크 냄새였다. 새 책을 받거나 새집에 들어서듯 퍼지던 윤전기 향이 좋아서 신문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향을 즐기기 위해 사물함 칸에 신문을 분류했다. 처음엔 똑같은 크기대로 나눴다. 신문규격을 배운 후 제목과 시간 순으로 모은 신문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웠다. 자연스레 중앙지와 지방지가 모이게 되니 하루 이슈를 언론사 대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잉크 냄새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필자의 모교는 NIE 선도학교였다. 학교는 신문활용교육 장려를 위해 가판대를 설치하고 신문을 제공했다. 필자는 `신문 디퓨저'를 그리워했으며, 더 자세히는 신문에 조금씩 흥미를 느끼고 있던 터였다. 등교해서는 가장 먼저 가판대로 가서 지방지와 중앙지의 발행부수를 비교하는 습관이 들었다. 또한 들쭉날쭉하게 발행부수가 달라져 수급에 차질을 빚었던 신문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날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세보기도 했다. 거기에 사제지간의 구독 경쟁이 벌어지자 신문 품귀 현상이 심해졌다. 행여나 수량이 적게 놓인 신문을 손에 넣고 복도를 거닐 때면 선생님들의 눈치가 보였다. 마치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손에 쥔 기분이었다.
NIE의 쟁점은 여기 있다. NIE는 신문에 대한 관심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까. 수동적 재미인가, 능동적 분석인가. 학생은 신문이 어색하다. 신문기사는 기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한다. 주변 어른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NIE는 공부보다 항상 하위개념이었기에 신문을 읽는다는 건 그날 할 일을 끝내놓은 여유로움을 뜻했다. 한 달의 한 번 대청소 시간만이 신문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어려서부터 문학을 즐겼던 필자의 눈에도 신문은 이방인의 것이었다. 첫 NIE 정리노트의 처음을 장식한 건 “~보람찬 하루였다”라고 귀결되는, 일기처럼 쓴 기사 요약이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NIE 시간의 교실 풍경은 처참했다. 어른들만 읽는 신문에 발을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만족했다. 신문을 읽는 이유보다는 어떤 기사를 스크랩하면 좋을지, 어떤 필기구로 요약해야 설득력 있는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관심'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해 기자의 꿈을 꾸고 있다. 초심을 잃을 때마다 NIE와 함께한 과거를 떠올린다. NIE에 대한 엉뚱한 관심은 사라졌지만, 지금 그 관심이라는 `촛불'이 모여 열정이라는 `횃불'을 태우고 있다. NIE는 신문기사 필사로 이어졌다. 펜 닳는 재미가 있고 까매진 손등을 보며 뿌듯해한다. 이제 `NIE'라는 말을 들으면 `네!'라고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됐다.